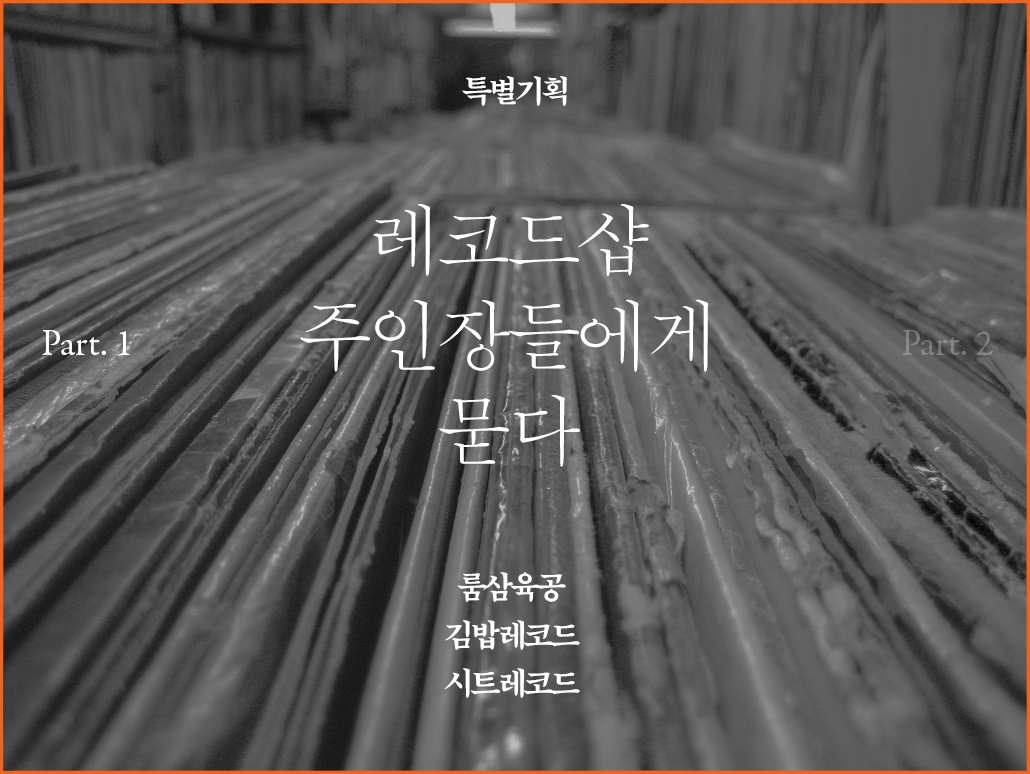실체화된 형태의 음반은 21세기에 들어 유동적인 디지털 파일로 변모하였고 음악 산업은 자연스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음악의 ‘비물질화’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속의 추억으로 치부되던 LP(Long Playing Record : 흔히 바이닐 Vinyl 또는 레코드 Record 라고 부르기도 한다.)가 다시 음반시장의 수면위로 오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무척 흥미롭다. 바이닐의 왕국인 미국의 레코드 시장은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영국의 레코드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100% 이상 급증했다. LP 열풍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고 한국 역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쿤스트할레에서 시작한 “서울 레코드 페어”가 벌써 3회 째를 맞이했고 서울의 곳곳에서 가지각색의 LP bar들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젊은 음악인들의 성지인 홍대에서는 퍼플 레코드를 중심으로 메타복스, 시트레코즈,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김밥레코즈까지 ‘레코드 구역’이 형성되었다. 2011년부터 영업 중인 방배의 레코드샵 RM360은 360Sounds 소속 아티스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근원적이고 직관적인 움직임을 좇는 바이닐 DJ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라벌레코드의 LP공장 폐업 이후 8년 만에 부활한 ‘엘피팩토리’에 힘입어 관록의 가수들부터 아이돌 스타의 앨범까지, 국내의 많은 뮤지션들의 음반이 우리 손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레코드의 바람은 거세게 몰아치진 않았으나 온기를 품은 채 슬며시 내려앉았다. 단순히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를 지금의 현상에 등치시키기 보다는 LP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과 음악 포맷의 변화, 이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CD매체, 그리고 기술의 변화로는 설명하기 힘든 대중들의 음악 수용 방식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두루 살펴 맥락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 자리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레코드 샵 김밥레코즈(Gimbab Records),룸360(RM360), 시트레코즈(Seterecords)의 세 주인장과의 인터뷰를 담았다.
(왼쪽부터 DJ Soulscape, 유지환, 김영혁 )
Part.1
1. LP샵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김밥 레코드 대표 김영혁(이하 G): 샵을 열기 전부터 김밥 레코즈라는 작은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때는 공동 작업실을 사용했는데 음반을 가져다 놓기에도 비좁을뿐더러 음악을 제대로 들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나의 삶의 터전이었던 홍대를 중심으로 작업실을 찾기 시작 했는데 생각보다 비싼 월세 때문에 순수한 작업실의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됐다. 어차피 해외 음반들을 수입도 하고 앨범 발매도 하고 있으니 이참에 레코드 샵을 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도 마침 1층이었다.
시트레코드 대표 유지환(이하 S): 음악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레코드 샵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전역 후 회현에 있는 LP love에서 주로 레코드를 샀는데 갈수록 외상값이 불어나더라. 별 수 없이 그 곳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샵을 운영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2007년부터 4년 정도 일했고 그 뒤에 시트레코즈(Seterecords)를 오픈했다.
RM360 대표 DJ Soulscape(이하 R): 원래 RM360 지하를 360Sounds 스튜디오로 쓰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공간이 부족하던 차에 건물 1층에 자리가 났고 같이 계약했다. 그 때가 2010년 이었을 거다. 초창기에는 통신판매 방식으로 레코드를 팔다가 2011년경부터 아예 레코드 샵으로 전환 하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정식 레코드 샵인 RM 360을 오픈했다.
2. 처음 샀던 레코드와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 말해 달라.
G: 중학교 시절에 처음 판을 샀다. 그 시절에는 형이나 누나를 따라 빌보드 차트 순위에 있는 팝들을 즐겨 들었다. 처음에 두 장을 샀는데. 그 중 하나가 브루스 혼스비 앤 더 레인지(Bruce Hornsby & The Range)의 [The Way It Is]이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투 팍(2pac)의 “Changes“라는 곡으로 혼스비의 음악을 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Changes”는 이 앨범의 동명의 타이틀 곡 ”The Way It Is”를 샘플링 했다.) 또 하나는 본조비의 [Slippery When Wet].
S: 세 장 정도를 샀는데 기억이 확실치 않다. DJ Shadow의 [You Can’t Go Home Again], De La Soul과 Ozomatli가 함께 한 싱글 “1,2,3,4”, 그리고 Blackalicious의 12“(인치)를 한 장 샀는데 뭔 질 모르겠다.
R: 90년대 초 즈음이었나. 방배역에서 얼마 멀지않은 거리에 레코드 샵이 하나 있었다. 그 곳에서 수입반인 비스티 보이즈(Beastie Boys)의 1집 [Licenced To Ill]과 라이센스로 발매된 슈가힐 갱(Sugahill Gang)의 셀프 타이틀 앨범을 구매했다. 당시에 비스티 보이즈는 워낙 좋아했지만 슈가힐 갱은 내 취향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지 않나. 어렸을 때 누군가 “이거 하나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하면 괜히 솔깃해서 결국 사버리게 되는. 레코드 샵의 주인 아저씨가 힙합을 좋아하면 슈가힐갱의 앨범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것까지 함께 구매했다.
3. 본인의 컬렉션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은?
G: 뚜렷하게 하나를 언급하기 힘들다. 나는 콜렉터 라기 보다는 음악 애호가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아끼는 LP는 없다. 좋아하는 음악은 전부 LP로 구하려고 하고 그중에는 고가의 LP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앨범에 대한 애정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S: 나는 콜렉터가 아니라서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LP는 없다. 다만 제대 후 Pharoah Sanders의 [Karma]를 듣고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이 앨범 때문에 프리 재즈(Free Jazz)를 듣기 시작했고 음악을 듣는 방식도 변했다.
R: LP로 발매된 나의 1집과 2집 앨범을 가장 아낀다. 1집이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레코드가 발매되지 않던 시기라 일 년 동안 가동이 되지 않던 공장에서 앨범을 찍었다. 그래서 프레스 퀄리티가 그리 좋지 않은 게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다.
4. 얼마나 많은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나?
G: 많지 않다. 개인 소유로 천 장 정도? 대학교 입학부터 음반사에 취업해 일하는 동안 주로 CD를 샀다. LP를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가게도 공간 특성상 다량의 LP를 두기 힘들어서 한 번에 둘러보기 좋을 정도로만 구비하고 있다.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앨범들 위주로 진열해놓았다.
S: 나는 내가 소장하고 있는 LP들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샵을 오픈하고 얼마 안됐을 때는 샵에서 판매하는 LP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LP의 경계가 약간 애매했다. 그 중에서도 천 장 정도의 LP는 아끼던 것들이라 따로 빼놨는데 결국 다 팔고 현재는 이백 장 정도만 남았다. 샵의 레코드는 7인치가 7만장쯤 될 것이고 12인치는 3000장 정도?
R: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만 장 정도 된다. 샵에는 현재 물건이 다 빠져서 얼마 없다. 2000-3000천장 정도 되려나?
(Gimbap Records 샵 내부)
5. LP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
G: 대부분 소리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의 경우 LP만의 음질도 매력이 있고 판을 돌리는 것도 재미있지만 가장 큰 매력은 LP만의 패키지다. 포맷 나름의 특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LP가 MP3나 CD보다 우월한 포맷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LP는 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다른 매체에 비해 월등히 높다. 패키지 안에 포스터가 담겨 있거나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특별히 구분되는 매력이 있다.
S: 많은 사람들이 LP로 음악을 들으면 소리가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막 귀라 세세한 부분까지 느끼지 못한다. 다만 클럽에서 볼륨을 키웠을 때는 LP에서 나는 소리가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것 같다. 힘이 있다고 해야 하나. 또 다른 LP의 매력은 커버(Cover)다. 커버 하나만으로 구매 욕구를 폭발 시키는 LP들이 있다. 레코드의 커버 아트웍(Cover Artwork)에 빠져서 커버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찾아보기도 하고 커버만 확인한 채로 레코드를 구매한 적도 있다.
R: 사이즈(Size)가 크다.
6. LP샵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꼽자면.
G: 샵을 연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대답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일단 힘든 점이라 한다면, 추천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판들을 많이 팔고 싶은데 국내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물량을 수급 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LP의 경우에는 공급 자체가 많지 않고 소량 수입하다 보니 주문한 수량만큼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조이디비전(Joy Division)의 [Unknown Pleasures]같은 경우는 흔한 레코드지만 국내에서는 구경하기 쉽지 않다. 메이저사에서 발매된 기본적인 레코드까지 일일이 해외에서 구매하자니 운영하는데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고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 불편하다. 반면에 레코드샵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바이닐을 누군가 구매하거나 추천해드린 음반에 만족해하는 이들이 있을 때는 늙은이 같지만 예전 생각도 나고, 여러모로 즐겁다.
S: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 음반 산업은 아무래도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쉽게 늘어나기 힘들다. 그래도 장사를 하면서 소소한 재미가 있다. 샵의 수많은 LP들 중에 내가 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손님이 집어 갈 때는 보람도 생기고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
R: RM360은 레코드를 거래처에서 한꺼번에 받지 않고 한 장씩 골라 들여놓기 때문에 가격을 일일이 계산해서 판매를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혼자 다니면서 처리하기에는 이게 참 쉽지않은 일이다. 반대로 어린 친구들이나 디제이들이 샵에 와서 새로운 레코드를 사고 그 LP들로 클럽에서 플레이 할 때 보람을 느낀다.
(Seterecords 샵 내부)
7. 당신의 샵이 서울이란 도시에서 다른 레코드 샵과 어떤 차이점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G: 특별히 어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보단 그냥 동네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이 곳에 와서 재미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작은 공간에서 대박을 터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동네 도서관처럼 편안하게 와서 음악을 들어도 되고 레코드를 굳이 안 사도 된다. 그저 음악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근처에 더 오래되고 넓은 레코드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사는 앨범들은 거기 가보라는 말도 종종 한다. 따라서 손님이 찾는 모든 걸 다 갖다 놓아야겠다는 부담 같은 것도 없다.
S: 7만장에 육박하는 7인치.
R: RM 360은 DJ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의 취향이 뚜렷한 편이다. 주로 블랙 뮤직을 위주로 파티에서 플레이하기 좋은 음악들을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제이들이 플레이 할 수 있는 12인치 LP가 많다.
8. 샵을 찾은 손님에게 들은 질문 중 가장 황당했던 것은
G: 아직은 없다. 다만 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없고 공간도 작다는 말은 들어봤다.
S: 틴틴파이브 1집의 테이프가 있냐고 물어 보셨던 손님이다. 전화로 질문 하셨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아마도 틴틴파이브의 굉장한 팬이었으리라.
R: 샵을 찾은 손님께서 자기가 외국에서 사온 판이라며 주고 간 적이 있다. 감사하지만 황당했었다. 하하. 사실 RM360을 찾는 손님들은 이미 알고 오시는 분들이라 딱히 황당할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보다는 샵에서 항시 대기하고 있는 스텝들이 더 잘 알 것 같다.
9. 본인이 최근에 빠져든 음악이 있다면.
G: 딱히 없다. 다만 이상하게도 가게에서만큼은 70년대 후반의 Soul/Funk, Disco 음악들을 많이 듣게 된다. 60년대 사이키델릭(Psychedelic)도. 이전에 안 들었던 음악은 아닌데 유독 더 찾게 된다. 샵을 연 때가 여름이어서 그런가. 겨울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S: 사실 나는 최근의 음악 장르 보다는 과거의 음악을 선호하는 편이다. 비교적 최근 앨범을 꼽자면 위즈 칼리파(Wiz Khalifa)의 [O.N.I.F.C].
R: 동아시아의 음악들이다. 올 봄에 태국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접한 음악들이 좋았다.
(rm360 샵 내부)
10. 특별히 LP로 들어야 감칠맛이 나는 장르(Genre)가 있나.
G: 이건 잘 모르겠다. 최근 일렉트로닉장르는 소리를 구분하기 힘들다고들 하는데 그조차도 LP로 들으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진다. 장르의 맛이라기보다 LP자체의 맛이 있다.
S: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 것보다는 사람의 감정이 장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R: 특별히 LP가 우월한 장르는 없는 것 같다. 다만 12인치의 경우, 같은 앨범이라도 다른 포맷에는 담기지 않았거나 리믹스 곡들이 수록된 경우가 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
11. 그 LP를 가장 ‘맛있게’ 틀어주는 장비는 어떤 회사의 제품인가.
G: 장비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하드웨어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다. 그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저가의 장비를 쓴다. 그래서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S: 흔히들 사용하는 테크닉스(Technics)의 턴테이블을 쓰고 있다. 스피커는 싸구려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막 귀라 장비에 개의치 않는 편이다. 다만 내가 레코드샵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뒤에 아버지께서 집에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다며 고가의 마란츠(Marantz) 앰프를 들여놓으셨다. 근데 이게 확실히 돈 값을 한다. 굳이 내가 살 일은 없겠지만 비싼 데는 이유가 있더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반이 발매된 시기의 테크놀러지를 바탕으로 한 장비가 해당 음악과의 싱크로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R: 믹서의 경우에는 특성을 타긴 하지만 바늘이나 믹서,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테크닉스(Technics)의 턴 테이블을 선호한다.
12. 어떤 경로로 LP를 들여오나. 그리고 레코드를 구하기 위해 어떤 리서치를 하며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G: 레이블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절반이다. 나머지는 국내 수입사에서 골라오거나 해외에서 딜러들을 통해 들여온다.
S: 미국 유럽등지에서 구해오는데, 주로 내가 거래하는 곳들은 미국의 도/소매샵이다. 예전에는 이것도 은근히 경쟁이었다. 해외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레코드샵에 가면 나와 같은 각지의 딜러들이 음반을 체크하고 있다. 거기서 기본적인 LP들을 구매하고 그 곳을 빠져나면서 진짜 ‘레코드 샵’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의 샵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희귀반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지.
R: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블랙뮤직이다. 재즈(Jazz), 소울(Soul), 훵(Funk), 디스코(Disco)를 포함해 12인치 힙합이나 비교적 최신 레이블의 레코드도 취급한다. 신보 같은 경우에는 그쪽 레이블과 직접 이야기를 해서 들여오지만 대부분의 레코드는 직접 딜러들을 만나거나 레코드 쇼를 찾아다니면서 구했다.
Gimbap Record의 블로그 (http://gimbabrecords.blogspot.kr)
Seterecords의 홈페이지(http://seterecords.com)
rm360의 홈페이지 (http://rm360.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