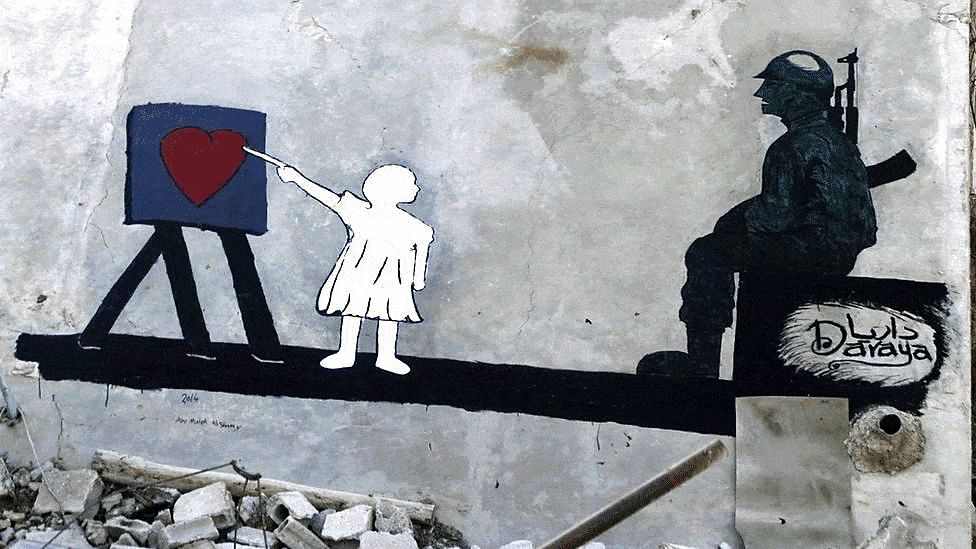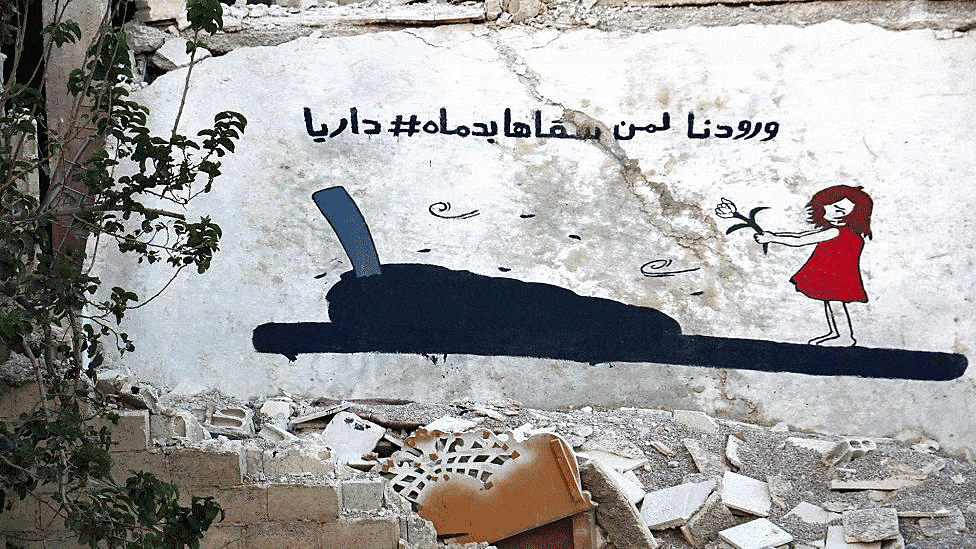빗발치는 총탄의 위협에서 단 하루의 평화도 용납되지 않은 나라 시리아. 최근 시리아 내전 그 최대 격전지인 알레포(Aleppo)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극적인 휴전 협정이 반나절 만에 결렬되며 다시 양측의 포격이 개시됐다. 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에서는 ‘알레포를 구하라’는 기치 아래 반전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프랑스 파리는 알레포 주민을 향한 마음을 담아 잠시 에펠탑 조명을 껐고, 일부 국가 시민들은 행진을 이어나가며 알레포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참극을 비판하고, 연대를 촉구했다.
한 소녀가 해골 더미 위에서 ‘희망’을 그리는 벽화 한 점이 몇 달 전, 외신을 통해 보도된 적 있다. 이 그림을 완성한 아부 말릭 알 샤미(Abu Malik al-Shami, 이하 알샤미)는 시리아 반군 소속이다. 2011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반군에 참여한 그는 총, 칼을 들고 정부군과 싸웠고, 전투가 없을 때는 벽화를 완성했다. 그림을 향한 열정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화가 마지드(Majd)를 비롯한 반군 동료들 역시 알샤미의 벽화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알샤미는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를 골라 다니며 무너진 건물 잔해에 물감을 입혔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간 다라야(Darayya) 지역에서 수십 점의 벽화가 탄생했다. 그에게 많은 힘이 된 마지드는 지난 1월, 사망했다.
시리아의 벽화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지나간 자리마다 폐허가 되는 내전 속에서 알샤미는 참혹한 죽음과 희망을 동시에 노래한다.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가. 몇 년간의 행적은 그에게 ‘시리아 뱅크시’라는 별명을 선물했지만, 알샤미는 결코 뱅크시가 될 수 없는 운명이다. 갓 스무 살을 넘긴 이 청년은 여전히 전쟁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