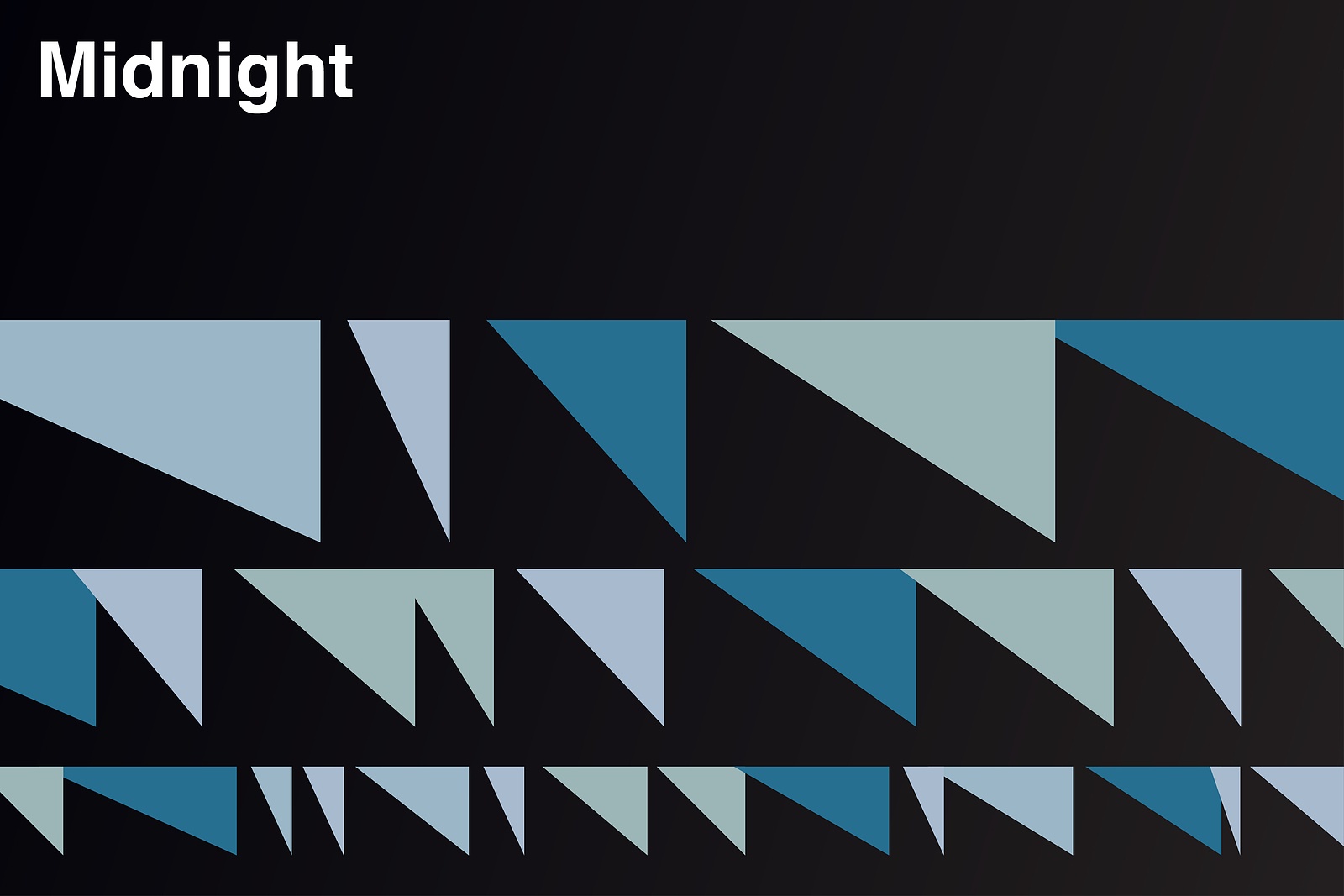
자정이 넘은 시간, 불 켜진 집이 몇 군데 남지 않았을 때쯤 잠자던 새벽을 깨운다. 술이 시가 되는 한밤중에 어울릴 만한 여섯 곡을 소개한다.
1. London Grammar – Strong
3년 전 이맘때쯤, 내 삶에 굵직한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환경에 놓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익숙한 것과 이별했으며,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다. 삶이 여러 단면으로 나누어진다면 분명 나는 다음 단면으로 넘어가는 어떤 경계선 위에 있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웠다. 그 애매함이 싫었지만, 이런 불분명함은 또 다른 경계선인 ‘자정’과 맞물렸을 때 더 극대화되었다. 그때 나는 런던 그래머(London Grammar)의 “Strong”으로 그해 가을을, 그 밤을 났다. 고요한 듯 울림 있고, 안정되는 듯하다가도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이 곡은 불분명한 밤들을 닮았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난 지금의 나는 또 다른 경계에서 새로움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절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미묘한 순간을 받아들이며 이 곡을 듣는다. 여전히 밤과 잘 어울린다.
2. Kaytranada – Bus Ride (Feat. Karriem Riggins & River Tiber)
낮과 밤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억을 잃게 되는 날도 많지만, 나에게는 밤이 더 정돈된 채로 다가온다. 해가 지면 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인지 밤에 떠나는 여행 역시 즐기는 편이다. 잠들기 전 도착지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익숙한 곳을 떠나며 그간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밤이 편리하다. 자고 일어났을 때, 여행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낮에 이동하는 것보다 더 심적인 안정감을 준다. 케이트라나다(Kaytranada)의 앨범 [99.9%]에 수록된 2번 트랙, “Bus Ride (Feat. Karriem Riggins & River Tiber)”는 조용하게 어디론가 떠날 때 어울릴 만한 곡이다. 야간 버스에서 너무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건 썩 내키는 일이 아니니 이 정도의 앨범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동 시간에 비해 짧은 러닝타임이지만, 어차피 곧 잠드니까.
3. Yodelice – Talk To Me (영화 ‘Les petits mouchoirs’ 삽입곡)
정처 없이 파리의 거리를 헤맸다. 어느새 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 됐고, 모든 가게는 문을 닫아 오직 가로등만이 불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의 낯섦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 조용히 리무진 한 대가 지나가더니 얼마 가지 않아 근처의 한 가게 앞에서 멈췄다. 내 시선은 그 차를 따라갔고, 두려움을 잊을 만큼 예쁜 여성들이 이브닝드레스를 걸친 채 차에서 내렸다. 그녀들은 곧 불 꺼진 한 가게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쇼윈도 커튼 뒤로 보이는 그곳은 한 갤러리였고, 안에는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예쁜 여성들과 턱시도를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모여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해서 연신 두리번거렸다. 여전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한밤중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만큼 아득하다. 이처럼 ‘Midnight’은 나에게 뭐든 가능한 마법 같은 시간이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시간. 그러나 실제로 어디에선가 꿈같은 일이 벌어지는. 나는 이 시간을 사랑한다.
4. Player – baby come back
이 곡은 바야흐로 2009년, 싸이월드 시절 자주 훔쳐보던 L군의 싸이월드 배경음악이었다. 그때부터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고, 들을 때마다 그를 떠올렸다. 당시엔 그가 설정한 배경음악이라 그런지 마냥 좋았다. 가사도 모르는데 그냥 멜로디를 즐겼던 것이 분명하다. 일단 도입 반주가 너무 좋다. 고개를 절로 까딱까딱하게 하니까. 가사를 이해하는 지금은 허한 마음을 이 노래로 달래지 않았나 싶다. 직역하면 바보 같은 가사지만, 충분히 위로가 된다.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이 글을 마치려고 보니 가을이다.
5. Earl Sweatshirts – Chum
새벽의 문이 열릴 때, 새어 나오는 공기를 종종 음미한다. 이 시간은 마치 술과 같아서 적당히 취기가 오를 땐 모든 사유와 행동이 자유롭게 헤엄친다. 그러나 너무 취하게 되면 속도 메슥거리고 우스꽝스러운 짓을 반복하다가 결국, 토해버리고 만다. 숙취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벽 공기에 달라붙으면서도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는 곡이 필요한데, 요즘 날씨에는 얼 스웻셔츠(Earl Sweatshirts)의 “Chum”이 적합할 것 같다.
도입부에 들리는 개구리 울음소리는 창가에 내려앉는 바람과 함께 나를 딱딱한 아파트에서 시골 할머니 댁의 어느 여름밤으로 잠시 돌려놓는다.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책임지는 피아노 루프에 유년기 기억 어딘가로 침잠하다가도 묵직한 얼의 목소리가 다시금 나를 깨운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음악이라기보다는 리듬 자체가 주변 공기에 머무는 듯하다.
벌레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 대청마루에서 달빛이 천천히 사라지던 그 날의 밤을 다시 곱씹을 수만 있다면 한두 시간 늦게 자는 것쯤 그리 손해 보는 거래는 아닐 터. 물론, 네온사인이 휘청거리는 도시의 불면증 같은 새벽도 가끔은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나에겐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붙어 있던 일과와 분리되는, 또 다시 찾아올 하루에 앞서 잠시 책상 위 잡동사니에서 비껴갈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할 뿐이다.
문호진, 히키코모리
6. Sade – Smooth Operator
‘Midnight’. 첫 번째로 떠오르는 기억은 어릴 적 처음 밤을 꼬박 새운 날이다. 초등학생 때 새벽을 마주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탈 행위였는데, 한두 번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며 새벽이라는 시간대와 조금씩 가까워졌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한국에 불어 닥친 ‘바람의 나라’, ‘스타크래프트’,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 각종 온라인 게임이 그득한 피시방 문화로 인해 새벽을 마주하는 일이 잦아졌다. 공휴일 전날엔 친구들과 모여 PC방에서 밤을 새우곤 했다. 새벽이라는 시간대는 갈수록 더 익숙해졌다. 대학생이 되고 밤샘작업이 잦은 전공을 선택하면서부터 새벽은 오히려 낮 시간대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시간이 되었다.
낮에는 뭔가 마음이 꿀렁거리고, 지나가는 차 소리, 나를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듯한 햇빛, 차분하지 않은 대기처럼 다양한 요소에서 오는 혼란이 나에게 주의력 결핍을 가져다준다면, 새벽에는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처럼 사랑에 집중하기 좋다고나 할까. 이건 농담이고, 차분해진 공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잠들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두가 잠든 것만 같은 착각은 작업이나 게임, 독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지어 음식도 새벽에 먹으면 더 맛있다. 새벽 시간대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2시까지는 새벽 같지도 않고, 적어도 3~4시는 돼야 새벽 같은데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는 관계로 너무 짧아진 새벽이 아쉽기만 하다. 고로 소중한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도록 나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줄 샤데이(Sade)의 “Smooth Operator”를 추천한다. “코스트 투 코스트 엘레이 투 씨카고~♬”



